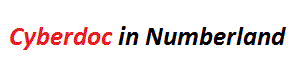[새얼뉴스레터72호] 노벨상을 타려면 초콜릿을 많이 먹어야 한다?
중얼 연습 2012. 11. 1. 16:52 |후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얼문화재단 뉴스레터 <새얼회보>에 짧은 글을 썼다. 이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글을 일 년에 네 번이나 써야 한다. 뉴스레터 편집을 겸하고 있는 <황해문화> 전성원 편집장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했다.
노벨상을 타려면 초콜릿을 많이 먹어야 한다?
황승식(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사회의학교실)
매년 시월이면 각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존 거든 교수와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유도만능줄기 세포 연구에 관한 업적으로 공동 수상했다. 과학 분야 수상자만 16명을 배출한 일본을 부러워하며 한국은 왜 1명도 수상하지 못하는 지를 질타하는 훈계와 충고를 담은 기사가 연도만 달리하여 넘쳐난다.
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뉴잉글랜드의학저널> 이번 주 호에 ‘초콜릿 섭취, 인지 기능과 노벨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프랜츠 메설리 박사가 2011년까지 국가별 초콜릿 섭취량과 노벨상 수상자 숫자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뚜렷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분석 대상 국가 중 스웨덴은 1인당 연간 6.4 kg의 초콜릿을 섭취하므로 1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32명으로 두 배가 넘었다. 저자는 먼저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 위원회가 후보자 중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애국심을 발휘한 결과이거나, 스웨덴 사람들이 특별히 초콜릿에 민감하여 조금만 먹어도 인지 기능이 촉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꼬았다.
두 번째 가설로 인지 기능이 활발한 사람들이 다크 초콜릿에 들어 있는 플라바놀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초콜릿을 더 많이 소비했을 가능성을 들었는데, 국가별로 묶은 자료의 특성 상 인과 관계의 방향을 거꾸로 해석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해에 걸쳐 초콜릿 소비와 노벨상 수상자 숫자를 비교할 만한 공통 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르고 지리와 기후 요인의 역할이 다르므로 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려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맺고 있다.
모든 의학 논문에는 저자와 이해 관계가 있으면 밝혀 놓게 되어 있다. 인용한 논문 말미에 메설리 박사는 매일 일정량의 초콜릿을 섭취하고 있고, 대부분 린트 사의 다크 초콜릿이라는 문장이 실려 있다. <뉴잉글랜드의학저널>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에 맞춰 통계 분석 결과를 넣고 논문 형식을 빌린 고급 유머를 구사한 셈이다.
노벨상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생리의학상도 기초 연구 중 새로운 결과와 해석으로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적용시킬 가능성을 찾아낸 연구에 주로 시상된다. 한국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를 다양하게 들고 있지만 솔직한 이유는 수준 미달이기 때문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진료에 짓눌려 연구는 승진을 위한 보여주기 수준인 경우가 많다. 대학의 연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0이 하나 적은 전체 연구비를 놓고 서로 다퉈야 한다. 연구비가 적다보니 규모 있는 연구는 엄두를 못내고 당연히 수준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단기 성과를 중시하다보니 유행을 따르는 연구가 양산되는 점도 문제다. 줄기세포가 유행할 무렵에는 모든 연구자가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융복합이 유행하니 모든 연구 계획서 제목이 융복합이다. 기초 의과학 연구 계획서 서식에 선진국 대비 수준이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성과를 계량적으로 써내라는 국가는 아마도 한국 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 당나라 말기 선승 임제 의현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도와 법을 터득한다고 하였다. 노벨상을 타겠다고 연구해야 노벨상을 타는 것이 아니고, 빌보드 차트 1위를 해야겠다며 곡을 만들어야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기초 의과학 연구자가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계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면 한국인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이라는 경사를 볼 확률이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이런 지원이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에 급히 사온 다크 초콜릿을 베어 문 입맛이 쓰긴 하다.
(새얼뉴스레터 2012년 72호)
'중얼 연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더 나은 의사, 더 나은 환자, 더 나은 결정: 2020년 보건의료에 대한 상상 (0) | 2013.02.19 |
|---|---|
| [JAMA] 유전체학과 보건의료 불평등: 통계적 차별의 역할 (0) | 2012.11.09 |
| 디스커션 쓰기 (0) | 2012.09.05 |
| [인용] 돌팔이의사 노릇 하는 바보 (0) | 2012.07.08 |
| [인용] 의사 말을 안 듣는 바보 (1) | 2012.07.03 |